박소진 시인 에세이 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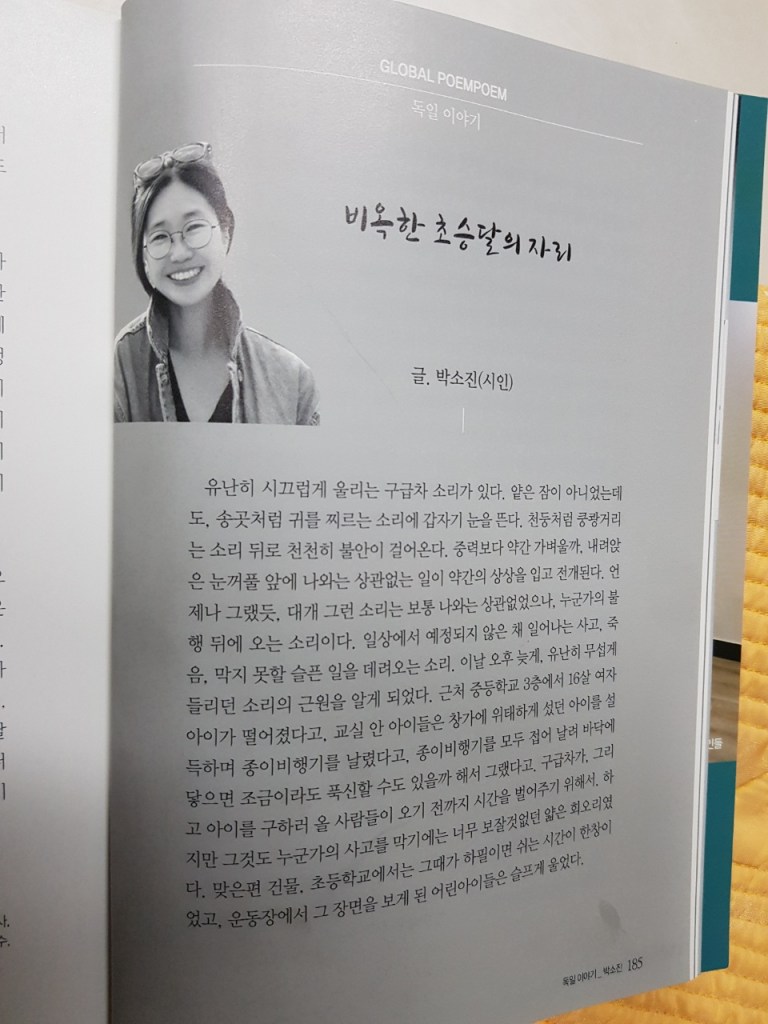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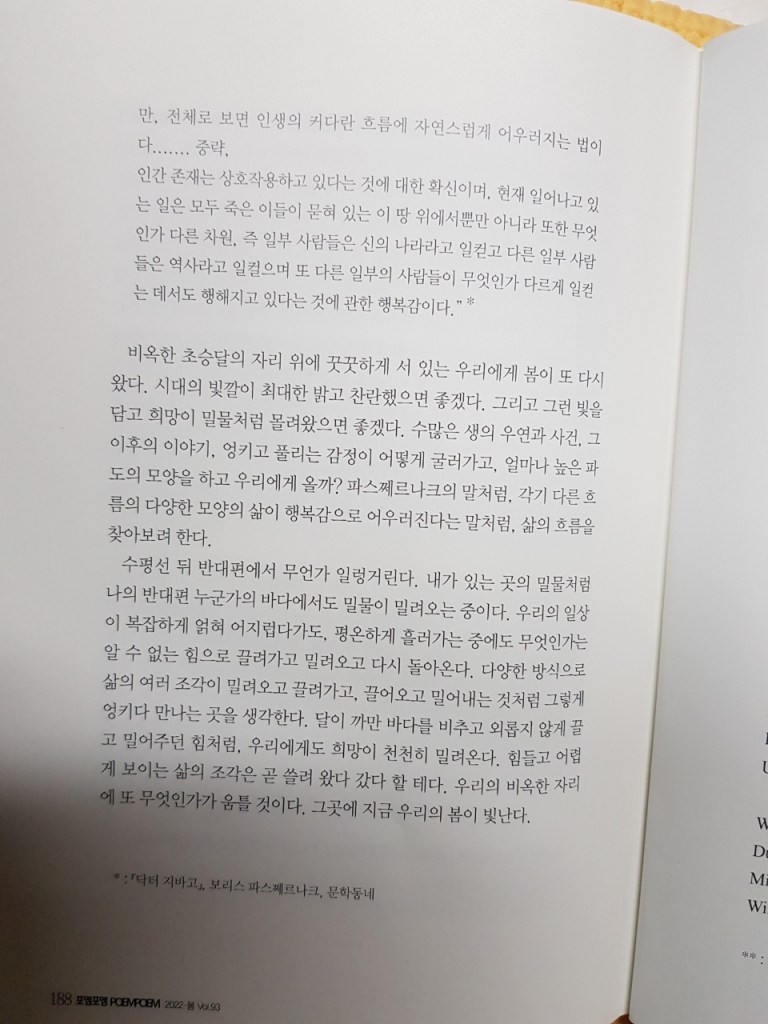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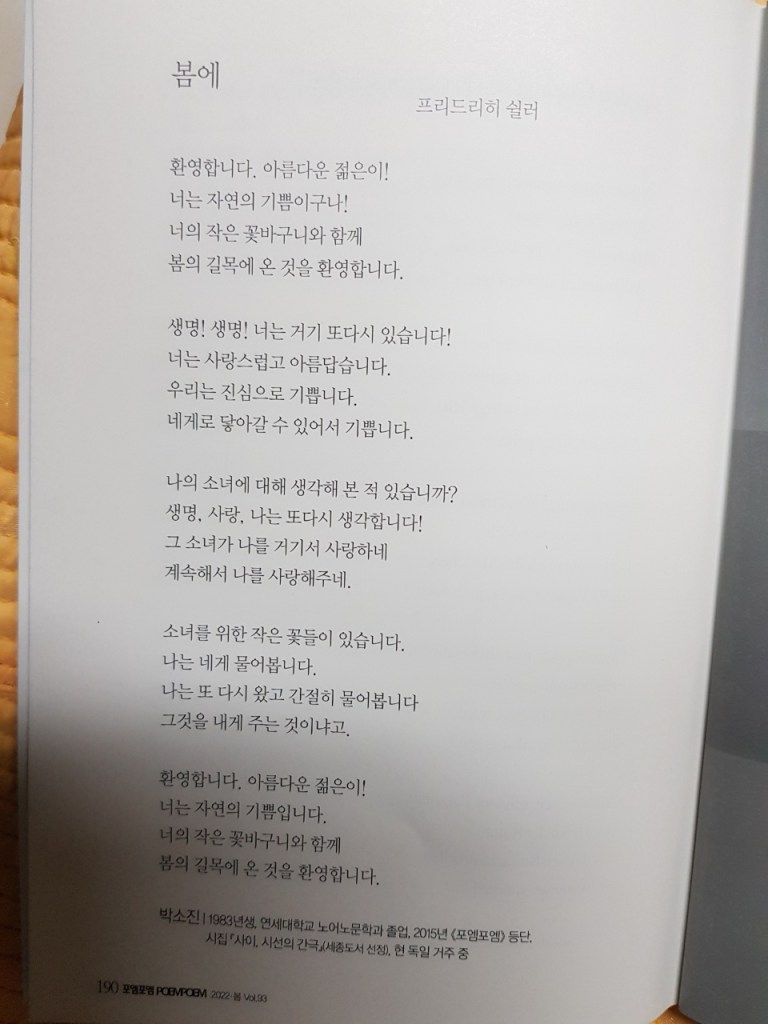
포엠포엠 2022년 봄호
글로벌 포엠포엠
비옥한 초승달의 자리
박소진
유난히 시끄럽게 울리는 구급차 소리가 있다. 얕은 잠이 아니었는데도, 송곳처럼 귀를 찌르는 소리에 갑자기 눈을 뜬다. 천둥처럼 쿵쾅거리는 소리 뒤로 천천히 불안이 걸어온다. 중력보다 약간 가벼울까, 내려앉은 눈꺼풀 앞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약간의 상상을 입고 전개된다. 언제나 그랬듯, 대개 그런 소리는 보통 나와는 상관없었으나, 누군가의 불행 뒤에 오는 소리이다. 일상에서 예정되지 않은 채 일어나는 사고, 죽음, 막지 못할 슬픈 일을 데려오는 소리. 이날 오후 늦게, 유난히 무섭게 들리던 소리의 근원을 알게 되었다. 근처 중등학교 3층에서 16살 여자아이가 떨어졌다고, 교실 안 아이들은 창가에 위태하게 섰던 아이를 설득하며 종이비행기를 날렸다고, 종이비행기를 모두 접어 날려 바닥에 닿으면 조금이라도 푹신할 수도 있을까 해서 그랬다고. 구급차가, 그리고 아이를 구하러 올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도 누군가의 사고를 막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던 얇은 회오리였다. 맞은편 건물, 초등학교에서는 그때가 하필이면 쉬는 시간이 한창이었고, 운동장에서 그 장면을 보게 된 어린아이들은 슬프게 울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계획에 없이 무력해졌다. 코로나가 찢어놓은 삶은 희망을 처참하게 무너뜨렸다. 너무 많은 상실을 경험해야만 하는 까만 동굴 속에 있는 듯하다. 붕괴한 일상을 과연 다시 다질 수나 있을까, 의문이다. 많은 이들은 구원을 빌고, 불행이 피해가길 빌었지만 결국 죽음과 비슷한 방식으로 삶이 부서졌다. 지구 깊숙한 곳까지 깊고 깊은 절망의 파도가 밀려온다. 세계 곳곳마다, 물길이 닿지 않던 안전한 육지처럼 보이던 곳에도 파도가 서럽게 치는 중이다. 썰물이 지나간 자리에 너무나 빨리 무언가 밀려들어 온다. 물은 아주 세차게 다가왔다. 아주 가끔, 파도 위에 휘파람 부는 바람이 지나가면 이내 잔잔해지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파도를 치며 곧 고요를 덮는다. 미처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예고 없이 몰려오는 물이다. 그 위로 그치지 않을 바람이 분다. 세찬 파도가 우리의 삶을 여전히 할퀸다. 내게 밀물은 무서운 편이었다. 적응된 일상적 삶의 발목에 고인 물이 갑자기 빠져나가 이내 그 자리를 채우던 낯선 삶의 모습이었다.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 펜데믹이 가장 그렇듯.
계절은 환희에 잠겨 있는데, 왜 나의 낱말은 아직도 상실의 계절에 머무르는지. 왜 거기서 다리를 절며 서 있는 것 같은지. 그러다 고개를 들었다. 거기 손톱으로 꾹 누른 자국 위에 둥둥 떠 싱긋 웃어 보이는 눈이 있다. 달은 모양을 바꿔가며 매일매일 자신 쪽으로 바닷물을 끌어가고 밀어준다. 이끌어주는 존재는 위안의 고삐를 쥔다. 온전한 보름과 그믐, 초승달의 모양을 몇 번 거치는 중에 또다시 봄이 왔다. 이 순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와 감정이 어디론가 쓸려가고 깨끗한 모습으로 오고 있다. 여전한 코로나 펜데믹 속, 끝나지 않을 듯이 보이는 절망도, 각자의 슬픔과 걱정의 깜깜한 동굴도, 타인에게 사슬처럼 전염되는 행복도 어느새 쓸려가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 섞이고, 또 정화되어 썰물처럼 내게 다시 닿으러 온다.
비옥한 초승달의 자리라고 불리는 문명(文明)을 이루며 우리는 자라나기 시작했다. 지구 곳곳에서 상상도 할 수 없을 아주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삶을 다지고, 각자의 모양으로 빚어 왔다. 빚어낸 모양은 다 다르면서 예뻤다. 그들은 우리가 되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지탱해 올 삶의 그릇 속에 많은 밀물과 썰물을 끌어왔다. 파도 위에 이야기를 담았다. 이야기는 여러 모양이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부서트리고 있는 듯한 많은 절망이, 그리고 그것을 덮어 부수어 버리는 희망 같은 모양이었다. 그렇게 비옥한 초승달의 자리 위에서 사람들은 축축한 어둠과 바람에 쓰러진 나무를 다시 당겨 올리고, 숲을 만들고 아름다운 선율처럼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를 들어왔다. 그곳을 비추던 달이 있었다. 거기에 있던 캄캄한 절망을 쓸어가고, 밀려오는 생명의 바닷물을 끌어주는 달의 힘이 지금처럼 있었다는 것이다. 달이 바다를 끌어가며 늘 곁에 있듯이 비옥한 초승달의 자리 위를 살아왔고, 또 살아 내는 모든 우리에게 희망은 깊고 우렁차게 파도 친다.
3층에서 뛰어내린 아이의 슬픈 결말이 사람들의 마음속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크고 무서운 파도가 일어났을까, 어떤 마음이 밀려왔고 쓸려나갔을까, 우리를 쓸어가고 훑어가는 많은 이유를 생각한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운 코로나 펜데믹을 어떻게 결말지을 수 있을까 역시. 우리에게 일어날, 그러니까 영영 알지 못할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양의 파도를 만들까.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은 이제 무엇을 다시 가지고 돌아올는지.
보리스 파스쩨르나크의 『닥터 지바고』에 나오는 문장을 옮겨 적는다.
“이 세상의 모든 운동은 따로따로 보면 모두 계산된 분별이 있는 것이지만, 전체로 보면 인생의 커다란 흐름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법이다……. 중략,
인간 존재는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모두 죽은 이들이 묻혀 있는 이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인가 다른 차원, 즉 일부 사람들은 신의 나라라고 일컫고 다른 일부 사람들은 역사라고 일컬으며 또 다른 일부의 사람들이 무엇인가 다르게 일컫는 데서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에 관한 행복감이다.” *
비옥한 초승달의 자리 위에 꿋꿋하게 서 있는 우리에게 봄이 또 다시 왔다. 시대의 빛깔이 최대한 밝고 찬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빛을 담고 희망이 밀물처럼 몰려왔으면 좋겠다. 수많은 생의 우연과 사건, 그 이후의 이야기, 엉키고 풀리는 감정이 어떻게 굴러가고, 얼마나 높은 파도의 모양을 하고 우리에게 올까? 파스쩨르나크의 말처럼, 각기 다른 흐름의 다양한 모양의 삶이 행복감으로 어우러진다는 말처럼, 삶의 흐름을 찾아보려 한다.
수평선 뒤 반대편에서 무언가 일렁거린다. 내가 있는 곳의 밀물처럼 나의 반대편 누군가의 바다에서도 밀물이 밀려오는 중이다. 우리의 일상이 복잡하게 얽혀 어지럽다가도, 평온하게 흘러가는 중에도 무엇인가는 알 수 없는 힘으로 끌려가고 밀려오고 다시 돌아온다.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여러 조각이 밀려오고 끌려가고, 끌어오고 밀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엉키다 만나는 곳을 생각한다. 달이 까만 바다를 비추고 외롭지 않게 끌고 밀어주던 힘처럼, 우리에게도 희망이 천천히 밀려온다. 힘들고 어렵게 보이는 삶의 조각은 곧 쓸려 왔다 갔다 할 테다. 우리의 비옥한 자리에 또 무엇인가가 움틀 것이다. 그곳에 지금 우리의 봄이 빛난다.
An den Frühling von Friedrich Schiller **
Willkommen, schöner Jüngling!
Du Wonne der Natur!
Mit deinem Blumenkörbchen
Willkommen auf der Flur!
Ei!ei! da bist ja wieder!
Und bist so lieb und schön!
Und freun wir uns so herzlich,
Entgegen dir zu gehn.
Denkst auch noch an mein Mädchen?
Ei, Lieber, denke doch!
Dort liebte mich das Mädchen,
Und ‘s Mädchen liebt mich noch!
Fürs Mädchen manches Blümchen
Erbat ich mir von dir –
Ich komm’ und bitte wieder,
Und du? – du gibst es mir?
Willkommen, schöner Jüngling!
Du Wonne der Natur!
Mit deinem Blumenkörbchen
Willkommen auf der Flur!
봄에
프리드리히 쉴러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젊은이!
너는 자연의 기쁨이구나!
너의 작은 꽃바구니와 함께
봄의 길목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생명! 생명! 너는 거기 또다시 있습니다!
너는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기쁩니다.
네게로 닿아갈 수 있어서 기쁩니다.
나의 소녀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생명, 사랑, 나는 또다시 생각합니다!
그 소녀가 나를 거기서 사랑하네
계속해서 나를 사랑해주네.
소녀를 위한 작은 꽃들이 있습니다.
나는 네게 물어봅니다.
나는 또 다시 왔고 간절히 물어봅니다
그것을 내게 주는 것이냐고.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젊은이!
너는 자연의 기쁨입니다.
너의 작은 꽃바구니와 함께
봄의 길목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 : 『닥터 지바고』, 보리스 파스쩨르나크, 문학동네
** : 프리드리히 쉴러의 시, <An den Frühling>를 직접 번역하여 「포엠포엠」2022년 봄호에 소개합니다.
박소진
1983년생,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졸업, 「포엠포엠」 2015년 등단, 『사이, 시선의 간극』세종도서, 현 독일 거주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