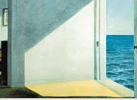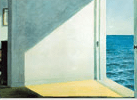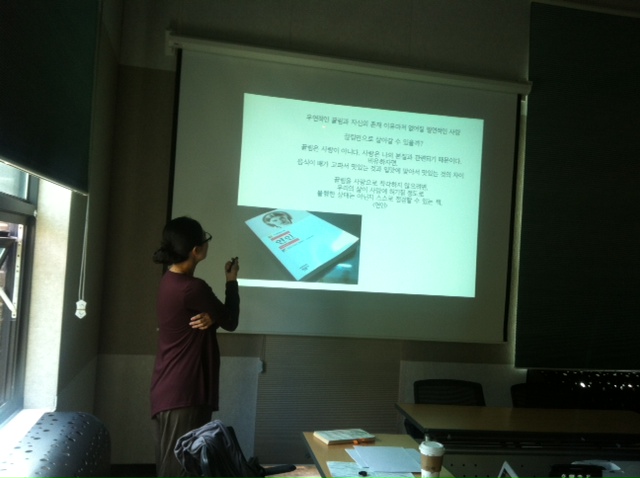내가 하는 학문과 근근히 하고 있는 강의는 절대 작품에 대한 독자의 판단을 규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
절대로 이 작품은 이러 이러한 특징과 주제, 인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절대로.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에룬다. 쓰레기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강의하는 강사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에겐 조금 미안하지만. 분명하게 말한다. 문학은. ‘자아’가 사유하는 것으로 (욕망 덩어리인 ‘나’가 사유하는 것이 아닌- 그런 ‘나’는 사유할 수 없다) 그 사유대로 빛을 발하며 자아가 발하는 빛으로 삶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삶에 대한 절대 기준을 알게 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학문은 분명 되돌려 주는 것이 있다. 그것은 허영의 전시장에서 쓰이는 명예나 돈, 뭐 그딴게 아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과 자신감이다. 나는 분명 이렇게 믿는다.
때문에 내가 어떤 작품에서 뽑아 온 주제는 이 전체에 대한 것이예요.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폭력이다. 타자에게 작품을 읽을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문학의 상상력을 말살시켜 버리는 것이다. 그럴 권리는 없다.
그래서 나는 열어두고 멀리 보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타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더라.
8, 9월 그리고 10월 첫 주까지의 거창한 이름으로 시작한 강의들이 진실로 내면의 자아를 탐색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문학의 목적임을 일깨우기 위한 나의 강의가 이제 조금씩 사람을 변하게 하고 있음을 느낀다. ‘내 안의 자아를 만나 변화된 빛’을 발하는 그녀들(강의 참여자)을 보면 그 뿌듯함과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가 벅차다. 날이 지날 수록, 더욱 열심히 참석하는 그네들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이 문학이 흐르는 순간이며 온 자아들이 형태 밖에서 춤추는 공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