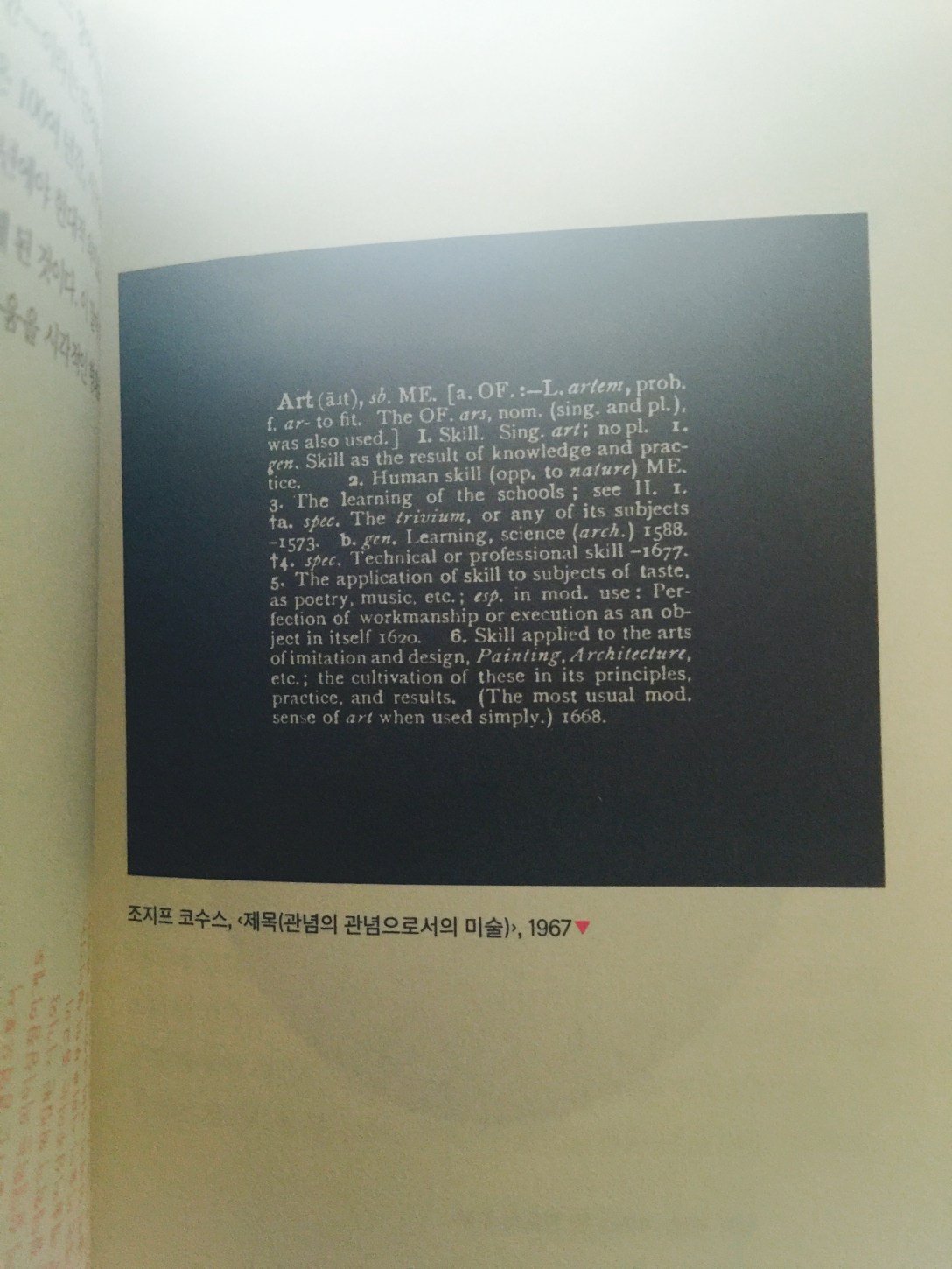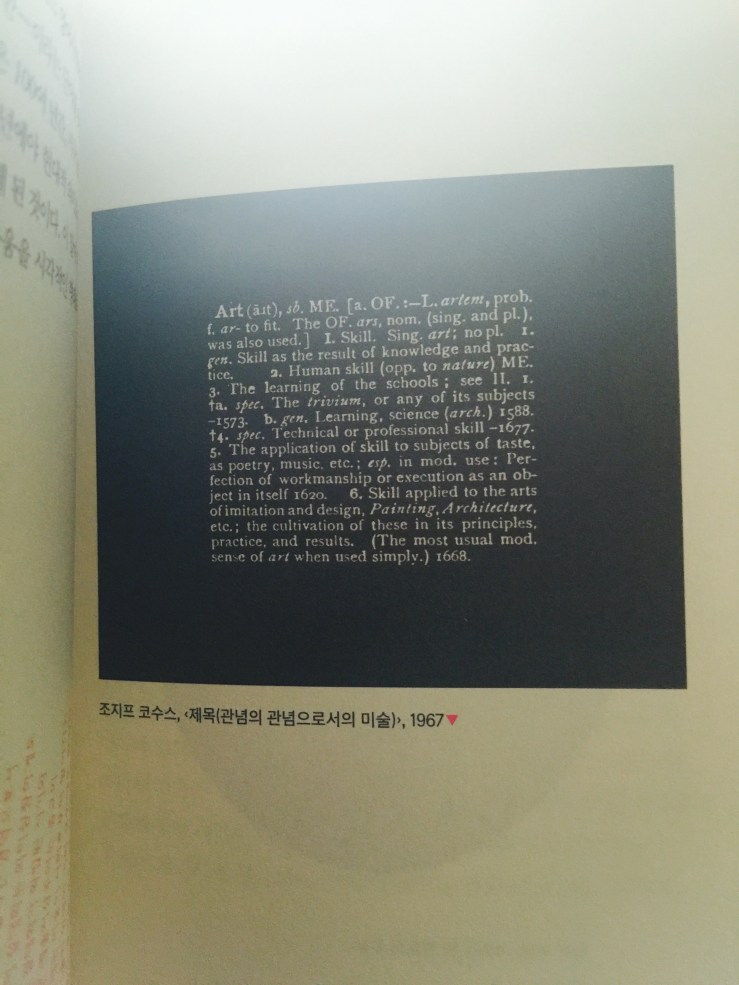나의 문학적 canon(포스트모던문학을 지지하면서 canon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아이러니지만) 의 은 근대 이후의 합리주의를 기반한 일종의 canon과는 다르다. 리오따르의 포스트모던과 그 맥을 같이하며, 일종의 사고의 탈권력화를 실재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텍스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또한 어떠한 해석도 완전할 수 없다라고 밝힌 데리다의 그것 처럼, 텍스트의 다양성이 사유의 확장을 넘어서 사유는 결코 대상을 궁극적으로 묘사할 수 없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signifikant는 signifikat에 대해 결정적인 것을 말하지 못하며, 현실에 대해 사유가 생각하는 것은 실재성 전체 중에서 단지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은 리오따르의 포스트모던의 조건이며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언어철학에 의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내가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시학과 언어적 질서의 관계도 이 ‘전체’ 속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언어적 질서라는 이성을 해체시킨 ‘무엇인가’를 위해.
포스트모던에 관해서는 볼프강벨쉬의 정리가 제일 괜찮은 것 같고, 본 홈페이지에 발제문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니 참고.
리오따르를 읽고자 하는 분들은 Essays zu einer affimativen Asthetik을 참고해도 좋을 듯.